'주역의 대가' 김석진 옹 인터뷰
올해 어렵지만 작년보다 나을 듯
스스로 애를 쓸 때 하늘이 돕는다
주역은 점서 아닌 최고의 철학서
올해 '총선', 빈 수레가 요란하다 대산 김석진 옹은 "이제는 '주역은 점서'라는 선입견을 벗어날 때가 됐다. 주역은 최고의 철학서"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전국을 돌면서 30년 동안 주역 강의를 하던 김석진 옹. 30년간 강의하면서 단 한 번의 결강도 없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중앙포토] 대산 김석진 옹은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주역의 괘대로 이야기를 할 뿐이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공자는 '주역'을 담은 죽간의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지도록 주역을 연구했다. [중앙포토] 영화 '공자'에서 배우 저우룬파가 공자 역을 맡았다. 김석진 옹은 "공자께서 '주역'을 사라질 것을 걱정해 점서의 형태로 남겨두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포토] 김석진 옹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간단한 기체조를 한다. 그는 "자고나서 입 안에 처음 고이는 침을 삼키면 건강에 무척 좋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대산 선생은 올해 93세다. 오전과 오후 30분씩 집 앞에 있는 몽촌토성을 날마다 바람을 쐬며 걷는다. “천일, 지이, 천삼, 지사(天一 地二 天三 地四)…”하면서 왼발 오른발 소리를 붙이며 걷다 보면 “뒤에 오던 사람이 어느새 저만치 떨어져 있다”고 말할 정도로 건강하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나라 안으로도, 나라 밖으로도 힘겨웠다. 새해 첫날 제자들이 신년하례를 와서 꼭 묻는 말이 있다. “올 한해는 어떻습니까?” 그럼 대산 선생은 제자들과 함께 주역의 괘를 뽑아본다. 그렇다고 ‘결정론적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나쁜 운도, 운용하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역(周易)의 ‘역’은 바꿀 역(易)자다. 또 주역에는 노력할 때 하늘이 도와주는 ‘자천우지(自天祐之)’가 있다. 새해 벽두에 만난 대산 선생에게 ‘2020년의 주역적 전망’을 물었다.
![전국을 돌면서 30년 동안 주역 강의를 하던 김석진 옹. 30년간 강의하면서 단 한 번의 결강도 없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09/b797cb95-50d8-4b3f-8000-8fbf2a2a5083.jpg)
주역의 괘에는 체(體)와 용(用)이 있다. 올해는 ‘산천대축’이 체라면, ‘산화비’가 용이다. 대산 선생은 “체(體)가 몸뚱아리라면, 용(用)은 팔다리에 해당한다. 아무리 몸뚱아리가 좋아도 팔다리를 못 쓰면 나빠지고, 아무리 몸뚱아리가 나빠도 팔다리를 잘 쓰면 좋아진다. 주역은 좋은 괘가 나왔다고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좋은 괘가 나와도 애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산 선생은 ‘수염’을 예로 들었다. “주역은 괘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애를 써야 한다. 괘로 보면 작년보다는 희망이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기에 달렸다. 꾸미는데 수염처럼 해야 한다. ‘에헴!’하고 어깨 힘주며 수염을 아래로 쓰다듬기만 해선 곤란하다. 수염을 봐라.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 턱에 의지해서 움직인다. 그러니 ‘더불어’ 가야 한다. 상대와 함께, 상대에 응하면서 조화롭게 꾸며야 한다.”

![공자는 '주역'을 담은 죽간의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지도록 주역을 연구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09/3e7d98e3-eff5-4a72-bb85-b89a4861440d.jpg)
![영화 '공자'에서 배우 저우룬파가 공자 역을 맡았다. 김석진 옹은 "공자께서 '주역'을 사라질 것을 걱정해 점서의 형태로 남겨두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09/1a576139-cd74-4cba-aa74-20d8db62b173.jpg)

마지막으로 대산 선생에게 건강 비결을 물었다. 그는 평생 약도 안 먹고, 병원도 거의 가지 않는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눈과 코, 귀를 살살 비빈다. 눈을 뜰 적에도 천천히 깜박깜박하다가 뜬다. 누워서 자전거 타듯이 다리 운동도 한다. 다리를 꼰 채로 들었다 놓았다도 한다. 그럼 허리 아픈 줄 모른다. 또 자고 나서 처음 입 안에 고이는 침을 ‘옥천(玉泉)’이라 한다. 한 시간 가까이 입 안에 고인 침을 세 번에 나눠 삼킨다. 그걸 ‘체중선약(體中仙藥)’이라 부른다.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선의 약이다. 그만치 중요하다는 뜻이다.”
백성호 종교전문기자 vangogh@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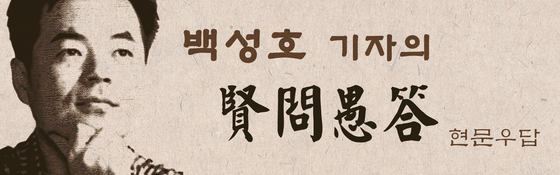
[출처: 중앙일보] '주역 대가' 김석진 옹 "올 총선, 빈 수레가 요란하기 쉽다"
'동양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순자(荀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0) | 2020.12.24 |
|---|---|
| 孟子(맹자) 告子篇(고자편)에서 大任是人(대임시인) (0) | 2020.06.29 |
| 주역 64괘풀이 (0) | 2020.01.12 |
| 水天需(수천수 -5) (0) | 2020.01.09 |
| 주역64괘 풀이 ( 풀이 출처 -> 德田의 문화일기) (0) | 2020.01.09 |